
<빌러비드>는 1800년대 후반에 미국을 살아가는 흑인에 대한 이야기다. 작가 토니 모리슨이 쓴 소설이다. 흑인이라는 정체성과 미국에서 벌어지는 흑백 갈등에 대해 한국에 살고 있는 나는 크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 미국을 가 본적도 없기 때문에 미묘한 차이를 알기는 더욱 힘들다. 과거에 흑인은 노예였다. 하나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 점은 꼭 흑인이 아니라도 한국에서도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 누가 노예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 알 길이 없다. 심지어 양반 가문이라고 해도 이걸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반면에 흑인은 너무 명확하다. 과거에 흑인은 무조건 노예였다. 노예가 아닌 흑인은 있을 수 없었다. 좋은 주인을 만나 노예지만 인간적으로 대할 수는 있을지언정. 흑인을 미국에 데리고 온 목적 자체가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다. 백인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건 분명히 아니다. 좀 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할까.
흑인이라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증명이 된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흑인은 무조건 노예다. 노예는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하나의 물건이다.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사고 팔 수 있다. 더구나 가격이 그렇게 높다고 할 수도 없다. 인간은 죽어서 쓸모가 하나도 없다. 돼니나 소는 죽은 후에 쓸모가 아주 많다. 그러니 흑인은 살아있을 때 가치는 인정받지만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한마디로 젊을수록 쓸모가 있고, 나이를 먹을수록 필요가 없어진다.
젊은 흑인 남자는 그런 면에서 쓸모가 아주 많다. 백인은 흑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봤다. 분명히 자신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존재인데도 인간으로 보질 않았다. 철저하게 쓸모에 따라 이용했을뿐이다. 심지어 흑인 여성은 아이의 젖을 주는 역할로 기능을 했다. 자신의 아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었다. 일을 해야 했기에 다른 아이에게도 젖을 먹어야했다. 추가로 단순한 모성이 아닌 잉태의 기능이 중요했다. 많은 아이를 낳으면 전부 주인에게 도움이 된다.
혈기왕성한 남성에게 성욕을 풀어주는 역할까지 해야한다. 이렇게 인간성보다는 기능적으로 존재했다. 남성이라고 다를 건 없었다. 오로지 일해야 하는 기능만 중요하다.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흑인을 팔아버린다.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그럴 때 철저하게 노예의 상태가 중요하다. 얼마나 젊은지 여부는 일하는데 있어 핵심 중 핵심이다. 말을 듣지 않아 흑인을 죽이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심장이 뛰는 일도 아니었다.

백인이 흑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죽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양심의 가책 따위는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볼 때 기르는 가축보다 못하게 여긴다고 해야할까. 이런 정서를 여전히 미국에서 갖고 있는 백인도 있다. 이걸 단순히 흑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색인종으로 확대해서 품고 있다. 이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을뿐. 드러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후폭풍이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소설을 읽어보면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있을 때 흑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지 알게 된다.
너무 끔찍하고 살고 싶지 않을 듯하다. 본인이 그렇게 태어났고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기에는 인간이라는 점이다. 인간이기에 생각할 줄 안다. 지신의 처지에 대해 자살을 생각할 정도다. 아니 생각을 넘어 실행하는 사람도 있다. 죽는 게 살아있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이다. 이를 무엇이라 하기에는 생존하는 의미가 너무 다르다. 제목인 빌러비드는 사람 이름이다. 세서는 흑인 여성이다.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며 계속 살아간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함께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기도 했다. 또한 빌러비드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존재다. 흑인으로 태어나는 건 축복일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흑인인 경우에는 결코 유쾌하지 않다. 어떤 삶이 펼쳐질지 눈에 선하다. 주인에게 도망치던 세서는 그런 이유로 자신의 여자 아이가 죽게 내버렸다. 또는 죽였다. 가슴에 묻었다는 표현이 아니다. 그 후에 덴버를 낳고 스위트홈에서 살아간다. 그곳은 자유를 찾아 도망간 남편의 엄마의 집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죽은듯이 살아가고 있었다.
폴디가 그 집에 찾아와 함께 3명이 살아간다. 어느날 어느 흑인 여자가 찾아왔다. 그는 빌러비드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덴버는 자신의 언니라는 걸 알게 되고 세서도 알게 되면서 서로 간장감이 흐른다. 이렇게 볼 때 소설은 판타지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 죽은 딸이 시간이 지나 생존했을 때의 나이로 왔다는 사실. 빌러비드의 존재를 서로 알아본다. 소설은 그러면서 세서의 숨겨진 진실과 흑인이 어떤 식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더 놀라운 건 이 내용은 마거릿 가너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아이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기 위해 죽였다는 사실이다. 소설 뒷 부분에 흑인으로 살지만 노동에 따라 돈을 받는다. 받은 돈으로 물건을 사고 거스름 돈도 받는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폴 디의 이야기가 나온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가능하다는 점에 폴 디가 느낀 감정이 내겐 오히려 생소하게 받아들여진다. 소설에 나온 모든 내용이 전혀 와닿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최소한 눈에 보이는 차별은 없어졌다. 이런 소설을 볼 때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반목은 쉬운 건 아닌 듯하다.
인간다움을 박탈당한 삶은 어떨까. 일을 해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주인이라도 결국에는 흑인으로 대할 뿐이다. 인간보다 못한 취급을 안 할 뿐이지 노예로 대할 뿐이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착한 주인이라고 다를 건 없다. 결국에 흑인 노예는 노예일 뿐이다. 인간이 아닌 특정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다. 겨우 100년이 살짝 지났을 뿐이다. 한국에서도 100년 전에는 똑같았다. 소설을 읽으면 읽기 어려워 안 읽히기도 하지만 답답해서도 안 읽힌다.
까칠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 다행이다.
친절한 핑크팬더의 한 마디 : 정말로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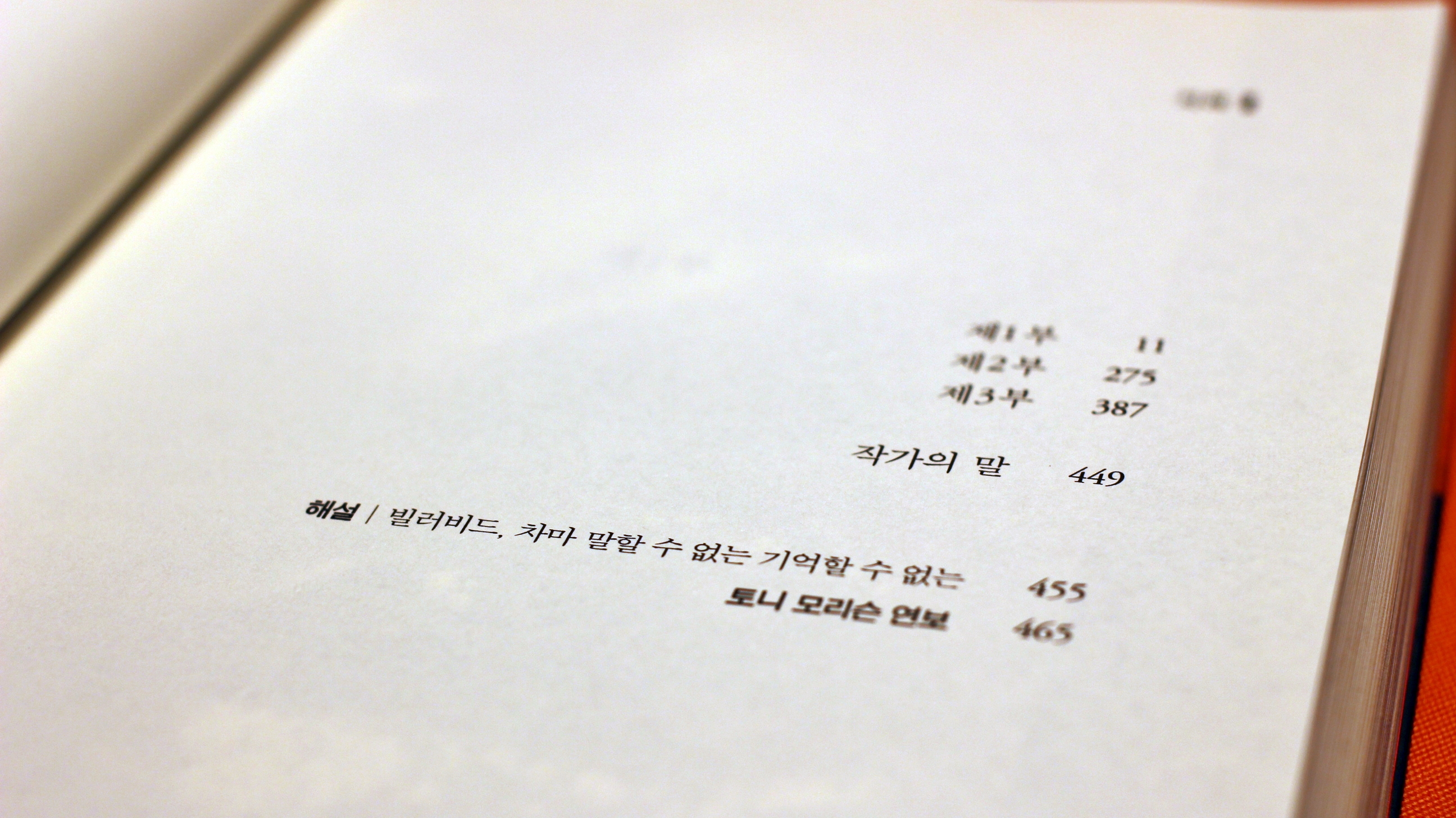
댓글
댓글 쓰기